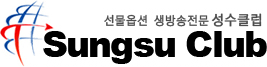내가 이루지 못한꿈 자식에게 읽게 하십시요
- 원인 없는 결과는없다
- 2017-08-18
불교의 경전에 ‘연기설(緣起說)’이 나온다.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하며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으로 맺어져 일어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어지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滅)하면 저것이
멸한다.”는 뜻이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는가.
만일 상처(傷處)가 났다면 다친 곳에 따라 상처가 팔이나 다리에
남기도 하지만 가슴 한 복판에 남기도 한다. 몸에 입은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서 약도 발라주고 걱정도 해주고 위로도 해준다.
약을 바르고 기다리면 아물고 흔적도 없어진다.
문제는 마음의 상처다.
마음에 입은 상처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으니 부상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없다.
주변에서 위로를 건 내지만 상처를 겉돈다.
시간이 약이라 하지만 상처는 아물 줄 모른다.
그런데 이 상처의 원인은 사람이다.
사람 중에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다고 가시로 무장한 채 세상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은 분명 후회로 돌아온다.
저절로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 걸음 내딛자.
아픈 만큼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게 인생이다.
날 아프게 한 사람이 지나가면, 눈물 나게 고마운 사람도 만나게 된다.
똥차 가면 벤츠 온다하지 않던가.
마음의 상처는 관계에서 생긴다. 상처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지켜야 했을 거리를 무시하다 큰 상처를 받는다.
시인 칼린 지브란의 ‘사랑을 지켜가는 거리’라는 시를 옮겨본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는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 마라.
그보다 너의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한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는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에 묶어 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희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가깝게 지내되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말일게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항상 받혀주어야 한다.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하라했다.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난로 대하듯 하라는 것이다
너무 가까이가면 데이고, 너무 멀리 있으면 차갑기 때문 아닌가?
중년이 되는 부부 사이도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우정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친구사이를 동양에서는 ‘도반(道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배움이
일어나면 스승이면서 친구요, 친구이면서 스승인 사우(師友)가 되는 것
이다.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다.
스승인데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낼 수 있고 친구인데 그를 스승으로 존중
할 수 있는 관계라면 인간이 태어나서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다.
중년이 되는 부부도 이런 관계가 되지 못하면 같이 못산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만 살아내는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인 것이다.
소 닭 보듯 데면데면 살지 않으려면 날마다 배우고 깨침이 있어야 한다.
꼰대로 살지 않고 꽃대로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