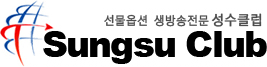내가 이루지 못한꿈 자식에게 읽게 하십시요
- 여측이심(如厠二心)
- 2017-11-23
여측이심(如厠二心)
“똥 누러 갈 적 마음 다르고, 올적 마음 다르다”는 인간의 양면성을 들어
내는 우리나라 속담이다. 자기가 급하면 친하게 굴다가 일이 끝난다싶으면
마음이 변한다. 병에 걸린 환자가 “병만 낫게 해주시면, 살려만 주신다면
뭐든지 다하겠다고 하다가 막상 병을 고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다.
변하지 말아야 하는 마음은 변하고, 변하지 말아야하는 마음은 변하고, 변
해야 하는 행동은 변하지 않는 것이 일반인가보다.
스코틀랜드에 “위험이 지나고 나면 신(神)은 잊혀 진다.”는 속담이 있는
걸 보면 동서고금을 통해 사람의 마음은 비슷한가보다. 시대와 환경만 변하
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정신도 바뀌고, 내 마음도 오락가락하니 세상
의 평가도 바뀌는 것이 당연한가보다.
‘토사구팽’한다 하지 않던가.
“교활한 토끼 사냥이 끝나면 그 사냥개는 삶아 먹힌다.”는 말이다.
말을 타고 나면 견마 잡히고 싶다는 속담도, 개구리 올챙일 적 생각 못한다.
는 속담도 있다. 유방을 도와서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세운 개국공신
한신이 결국 유방에게 버림을 받으며 하던 말이‘토사구팽’이다.
여측이심(如厠二心)의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다 내 탓이지요. 하면서 뻣뻣해진 고개를 조금만 숙이면 서로간의 삶이 편
해질 것을 그리 못합니다.
‘조변석개(朝變夕改)’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친다는 말로 한번 세운 계획이나 정해진 결정 따위
를 일관성 없이 자주 고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상황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인간의 마음을 빗댄 것이다.
甲 질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스스로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변화란 있을 수 없고, 甲乙 관계는 고정불변
하는 것이 되고 만다. 공자는“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고 했지만 “내가 스승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배움의 문을 닫아 버리면
더는 발전이 없기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