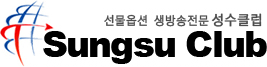내가 이루지 못한꿈 자식에게 읽게 하십시요
- 글 써보고 싶은가
- 2022-08-17
글 써보고 싶은가
글을 잘 쓸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난무하지만 그런 책을 읽는다고
글을 잘 쓰게 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공부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읽는다고 공부 잘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
문이다. 글을 잘 쓰려면 말 잘하기가 듣기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좋은 글을 많
이 잘 읽어야 한다. 글을 읽다 보면 마음에 드는 문장이 나온다.
어떤 글은 바늘처럼 나를 찌르고, 어떤 글은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고 어떤 글
은 무릎을 탁 치게 하고, 어떤 글은 나를 눈물짓게 한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갓끈을 씻을 것이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
으리라.”“향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법”“푸른색은 쪽에서 뽑아내지만, 쪽보다 푸르고, 얼음은 물로 만들어졌지만,
물보다 차다.”“꼬불꼬불하게 자라는 쑥도 삼밭에서 자라게 되면 받쳐주지 않
아도 저절로 곧게 자라며, 깨끗한 모래도 진흙 속에 놓이게 되면 저절로 더러
워진다.”
이런 글 들은 필사해서 보관해 두고 수시로 생각해보며 외우는 게 좋다.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실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중요한 것은 책을 많이 읽어 마음에 드는 문장을 찾는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내 마음을 잘 들려다 보아야 한다. 글쓰기에서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진정한 창의력은 기존에 지닌 지식의 결합과 재구성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힘이다.
질문이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질문을 만들어
내야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내가 아는 것을 글로 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내가 아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안다 그런 글은 쓰나 마나다.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글을 써서 알려고 하는 것 아닌가. 궁금증을 풀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으려고 하는 것이다.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기보다 내
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다. 결국, 글을 쓰기 위해서는 모른 것과 마주칠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철학자 볼테르는 “답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질문
으로 사람을 판단하라.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