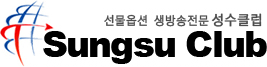내가 이루지 못한꿈 자식에게 읽게 하십시요
-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2023-02-12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함석헌, 법정 스님, 김동길, 이어령, 이들이 쓴 글을 읽으며 내가 책을 좋아하게 되고
지금도 매일 몇십 페이지씩을 꾸준히 읽고 있다.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비롯해 월간 <사상계>에 기고한 선생의 글
<씨알의 소리>는 밤잠을 설치게 했다.
특히 선생의 유언이라 할 수 있는 시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먼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선생의 글을 나는 읽고 또 읽었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비롯해 수십 권의 저서를 탐독했고 연세대 김동길 교수의
<길은 우리 앞에 있다> 를 비롯해 가노라 삼각산아, 링컨의 일생 등 김교수가 쓴 수십
권의 책을 모조리 읽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1934~2022)
88세로 세상을 마감한 교수의 책들 <한국인 이야기>를 비롯해 수많은 저서와 그의
유언이라 할 수 있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까지를 탐독했다.
나는 이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삶과 죽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씩 뜰 수
있었다. 인생은 다시 살 수 없지만 이분들처럼 세상을 의연하게 살다간 길을 작품을
통해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으러 간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
그런데 이 죽음을 직시하고 의연하게 살다간 사람들의 유서가 있다.
법정 스님은 <1932년~2010년> 78세까지 살았다.
1971년 스님의 나이 39세에 잡지에 기고한 <미리 쓰는 유서>라는 글이 남아 있었다.
“내가 죽거든 장례식이나 제사 같은 것은 아예 소용없다.
내게 무덤이라도 있게 된다면 그 차가운 빗돌 대신 내가 좋아하는 양귀비나 모란을 심
어달라 하겠지만 무덤도 없을 터이니 그런 수고는 끼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기능이 나가버린 육신은 조금도 지체할 것 없이 없애주었으면 고맙겠다.
옮기기 편리하고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라면, 아무 곳이나 화장을 해서 뿌렸으
면 한다. 행여 사리 같은 걸 남겨 이웃을 귀찮게 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 그 뜻을 받들어 스님이 죽었을 때 평소에 입은 옷 그대로, 천으로 시신을 덮고 관에
넣지도 않은 채 순천의 송광사로 운구해서 화장을 하고 유골은 불이암 후박나무 아래
뿌려졌다. 후박나무 아래 조그만 표지판에는 ”스님이 계셨던 곳, 유언에 따라 가장 아
끼고 사랑했던 후박나무 아래 스님의 유골을 모셨다“라고 적혀 있다.
김동길 교수는 <1928 ~2020 >94세를 살았다.
교수가 죽기 8년 전 87세 때 원고지에 직접 써서 세브란스 병원장에게 한 통의 서신으
로 보냈다는 유서의 내용이 있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 추도식을 일체 생략하고 내 시신
은 곧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기증해서 교육용으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누가 뭐래
도 이 결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고 적혀 있다.
교수가 살았던 대신동 자택은 이미 2020년 이화여대에 기증했으며, 편생 그가 쓰다 남
은 유물은 세상에 돌려주고 삶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놓고 교수는 떠났다.
성경은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났다”고 한다.
우리는 죽음에서 초상집에서는 인생을 배우기 때문일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먹고 마시는 잔치집
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미래를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당장의
기쁨만을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