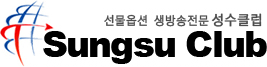-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 2025-07-09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던 일을 너무 빨리 너무 자주 그만두는 것 같다.
<개업과 폐업>이 수시로 바뀌는 사이에 경제적 손실도 크겠지만,
리스크를 감당하는 속마음은 얼마나 막막할까.
내가 자주 가는 이름난 식당 벽에
“맛을 내기보다는 맛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라고 쓰여 있다.
이미 맛으로는 승부가 났으니 이제 맛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주인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말이 생긴 것이다
생각했던 일은 풀리지 않고 답답한 생각이 많을 때마다 전주 한옥 마을
<혼불>작가 최명희의 문학관을 찾는다.
이곳은 최 작가의 50년 인생이 남긴 것들을 거의 다 전시해 놓았다.
특히 문학관 중앙에 전시된 원고 더미에 늘 눈길이 간다.
<혼불> 원고의 3분의 1인 분량을 쌓아 놓았는데 그 높이가 내 허리를 넘는다.
만약 모든 원고지를 다 쌓으면 3m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책 속에서 최 작가는 “나는 글을 단숨에 쭉 내려쓰는 ‘일필휘지’(一筆揮之)를
않는다. 원고지 칸마다 나 자신을 조금씩 밀어 넣듯이 글을 쓴다.”고 말한다.
최 작가의 모든 것을 밀어 넣은 <혼불> 10권, 4만 6천 여 장의 원고지를 묶어
낸 17년 간의 몸부림이 기적을 만들어 냈다. 기적은 이렇게 오는 법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도 ‘기적은 기적처럼 오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좋은 결과일수록 그것을 성취하는 데는 긴 시간과 간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생의 이치 아닌가.
벌은 ‘1g의 꿀을 얻기 위해 3.300 송이의 꽃을 찾아 다닌다.’고 한다.
우연한 행운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믿어야 할 것은, 행운이 아니라 흘리는 땀방울이다.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타고난 천재 화가가 아니었다.
그가 이탈리아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천지창조>를 그릴 때 4년 6개월
동안을 누운 채로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린 불편한 자세로 하루도 쉬지 않고
작업에 열중했다. 이처럼 최고의 삶은 그냥 주어지는 법이 없다.
현재 미국 문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으로 칭송받는 존 어빙이 쓴 소설
<가아프가 본 세상>은 수 백만 독자들에게 감명을 준 베스트 셀러 작품이다.
그가 자신의 습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남보다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가 남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어리석고 지독해 보일 정도의 부지런함으로 실패
와 역경과 슬럼프를 이겨 냈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작가로서 잘한 일은 초고를
완성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고쳐 쓰고 거듭 거듭 고치기를 반복했다.
나는 고치기를 반복한 <이야기를 짓는 목수>일 뿐이다.”
갑자기 폴 가드너의 말이 생각난다.
“그림에는 결코, 완성이란 없다.”
다만 흥미로운 지점에서 멈출 뿐이다."
어디 그림, 뿐이겠는가?
글을 쓰는 것도, 음식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