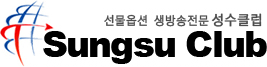- 헬스클럽이 우리의 몸매를 구해줄까?
- 2009-08-26
운동과 다이어트 범람의 시대다.
누굴 만나도 “다이어트 중이야” 혹은 “체중관리 중이야”란 말을 흔하게 듣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헬스클럽에 등록한 미국인은 1993년 2330만명에서 현재는 4500만으로 늘었고 이에 쏟아 붓는 비용만 매해 190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의 1/3가량이 비만이고 나머지 1/3도 과체중이다.
일찍이 웰빙과 운동의 중요성이 이보다 더 강조되던 시절이 없었는데 왜 우리의 체중은 줄어들 생각을 않는 것일까?
 |
다이어트 의지 위협하는 ‘보상기전’
올해 초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티모시 처치 박사는 미 공공과학도서관
온라인 저널(PLoS ONE)에 운동에 관한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운동하지 않는 과체중 여성 464명을 네 그룹으로 나눠 세 그룹은 주당 각각 72분,
136분, 194분씩 6개월 간 개인 트레이너와 운동을 하도록 하고 통제그룹은 평소 활동량을 유지하도록 했다.
식습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매달 전반적인 건강상태 체크와 함께 체중변화를 관찰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꾸준히 운동한 그룹의 체중이 더 많이 감소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네 그룹 여성의
체중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처치 박사는 이것이 ‘보상기전’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운동을 심하게 할수록 스스로에게 음식으로 보상을 주고자 하는 본능이 발휘돼
오히려 운동 전보다 후에 더 많이 먹게 된다”면서 “실험참가자들은 운동 후 식사를 할 때
야채나 과일보다는 칼로리가 높은 감자튀김이나 도넛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의지적인 자기 통제력이 반드시 보상기전을 불러온다는 흥미로운 실험결과도 있다.
2000년 미국 심리학회가 발행하는 심리학회지(Psychological Bulletin)에
발표된 논문에는 인간이 본능과 충동을 억누르고 발휘하는 자기 통제를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지는 근육’에 비교하기도 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쉬고 싶은 충동을 누르고 한 시간을 뛰었다면 자기 통제력이 닳아 없어져 먹을 것이나 휴식 등으로 보상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음식섭취 동기는 ‘칼로리 소모’
만일 한 시간 동안 걸어서 200~300 칼로리를 소비한 후 머핀 절반을 먹었다면
칼로리는 제자리걸음이다.
20분 동안 달린 후 이온음료 한 캔을 꿀꺽 마셔도 칼로리 손익계산에선 제로가 된다.
2001년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이 ‘비만 연구(Obesity Research)’ 지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파운드(약 4.5kg)의 지방이 근육으로 바뀔 정도로 격렬히 운동해도 살을 빼기로 작정했다면
매일 추가로 먹을 수 있는 열량은 겨우 40칼로리 정도다.
이는 버터 반 스푼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다.
하버드 대학의 영양학자 스티븐 고트메이커 박사는 “가장 강력한 음식섭취의 동기는
에너지 소비”라면서 “활동량이 늘어나면 더 먹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설명했다.
지난 해 고트메이커 박사는 국제비만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에서 538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운동을 시작한 후 어린이들은 운동으로
소비한 칼로리보다 평균 100칼로리 정도를 더 먹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움직이면 쉬고픈 항상성 기전도 작용
활동에 대한 보상이 휴식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
영국 페닌술라 의대 연구진이 지난 5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이 플리머스 지역의 세 군데 학교에 다니는 7~11세 아동 206명을 조사한 결과,
학교 체육시간의 길이에 상관없이 아동들의 일일 활동량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체육시간이 9.2시간으로 가장 긴 학교 학생은 방과 후 휴식을 취하는 반면
체육시간이 2.4시간, 1.7시간으로 짧았던 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 축구나 달리기 등으로 활동량을 늘였다는 것이다.
한편, 영국 엑시터 대학 연구진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가벼운 활동을 자주 하는 아이들이 축구나 달리기 등 격렬한 운동을 장시간 하는 아이들과
비교해 건강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인지기능 향상이나 암 예방 등 운동의 순기능이 과소평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연구결과들은 체중감소에 대한 현대인들의 강박관념이
오히려 악순환을 만든다는 경고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