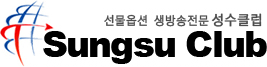- [세상읽기] 금융버블의 학습효과
- 2009-08-30
"투자는 주식을 사는게 아니라 기업을 사는 것…욕망의 거품 절제하고
사회적 가치 반영하는 투자문화 정착돼야"
멀게는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버블`에서 가깝게는 21세기 초 `닷컴 버블`처럼
인류 역사에서 버블 생성과 붕괴는 반복되어 왔다.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도 버블의 한 종류다.
최악의 금융위기는 지났다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지나가기 전에 이번 위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배웠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 세대들이 `금융위기 학습효과`를 통해 버블보다는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
그리고 `투기심리를 막을 의식개혁`으로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얼마 전 미국 일간지에서 금융위기 후 새로운 미국경제는 위기 전 과도한 소비와
부채 그리고 복잡한 금융자산 거품에서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적정가치는 그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의 현재가치로 결정된다.
그러나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그 결과 자산가격이 적정가치 이상으로 상승하고
여기에 과도한 낙관심리로 인한 투기심리가 발생하면 거품이 생긴다.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
튤립 버블이 왜 갑자기 붕괴하였는지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사람들이 이성을 찾아 천문학적으로 과대평가된 튤립을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튤립시장이 붕괴하였다. 우리나라는 특히 거품이 많은 나라다.
사회 도처에 거품이 도사리고 있다. 거품은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위기 후에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려면 우선 투자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투자자들이 가치에 투자하여야 한다. 자신이 투자하려는 기업이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재무적으로 얼마나 건실한지를 잘 알아보지 않고, 막연히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투자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사업을 사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경영활동에 경제적 가치 외에 사회적 가치, 윤리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문화가 창출되어야 한다.
일본의 저명한 신자유주의 신봉자였던 나카타미 이와오는 저서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에서 글로벌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강제력을 가진 `외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욕망 억제`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는 욕망의 거품을 절제하고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
거품을 낳는 근본원인은 비이성적인 투기 심리다.
시장심리학 개척자로 평가받는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서브프라임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 심리라고 하였다.
인간의 `비이성적 과열`이 투기와 거품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해법이다.
교육으로 이성을 회복하고 합리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번 금융위기는 교육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투기심리를 막을 의식 개혁 운동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투자문화를 선진화해야 한다.
투자문화가 일천한 우리나라가 수십 년 풍파를 겪은 선진국의 장기 투자 문화를 짧은 기간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투자자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칙이 없는 이윤에 대한 탐욕, 이윤 극대화에 대한 탐욕으로 시장은 오염되었고 세계 경제는
그렇게 망가졌다. 시장 참여자의 의식 개혁과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
투자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
요사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과잉 유동성도 투기심리와 결부되면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투자자들이 실패를 통해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차원에서 시장참여자에 대한 `바른 금융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를 통해 투기심리가 억제되고 또 다른 버블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실현하려는 사회적인 학습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교육계, 금융업계가 함께 나서기를 희망한다.
[정구열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