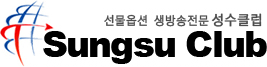- 물상위기: 위가 튼튼해야 약도 듣는다
- 2008-06-18
장성수
[물상위기: 위가 튼튼해야 약도 듣는다.]
병을 고치는 약이라는 것이 대체로 독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독성을 이용하여 병을
공격함으로써 치료하게 되는 것이다. 약을 무기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느데 적군을 물리치는
작용이 있는 반면 잘못 휘두르면 때로는 엉뚱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모든 잡병을 다스릴 때
우선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에 병을
고치도록 하며 위의 소화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혈에 병이
생기면 먼저 기운을 북돋아주어야 하는데 기운을 조절하여
주지 않고는 혈액 순환도 잘되지
못하는 이치이다. 그러므로 병을 치료하는 데는 기가
근본이 되며 이를테면 남편이 해당되니
남편에 해당되니 남편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아내가 따라서 노래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보약이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복용하여 소화시킬
수 있어야지 보약을 마시고 위가
나빠지면 보약의 구실을 못하게 된다.] [잡병편 권1
용약]
[대저 병을 공격하는 약은 병이 있을 때는 병이 그 약을
받지만 병이 가벼운데 약력이
중하면 위의 소화기능이 상하게 된다. 위의 소화 기능은
청순하고 부드러워 자극성 없는
것을 좋아하는데 음식물인 곡식, 육류, 채소, 과일 등은
위에 좋지만 약은 모두 성질이
편벽된 약리작용을 지니고 있으며 그 좋다는 인삼이나
황기 같은 보약도 역시 편성인데
하물며 공격지약은 더할 나위도 없다.] [잡병편 권1
용약]
병이 아주 급할 때는 앞뒤를 가릴 겨를이 없이 독한
약을 때려야 하겠지만 병이 일단
수그러지면 독한 약은 끊도록 하는 것이 약 사용의 정석인
것이다.
[옥녀영: 땀띠는 쑥 달인 물로 씻으면 좋다.]
땀띠를 한진이라고 하며 땀띠가 덧나서 종기가 된 것을
한진성습진이라고 한다.
옛사람들도 땀띠를 비자라고 하고 종기가 된 것을
비창이라고 하였다.
땀을 흘린다는 것은 인체가 체온을 자동 조절하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며, 더위가
심한 여름에는 하루에 맥주병 4개 정도의 땀이 나오며
운동을 하면 이의 갑절 정도가
나온다니 놀라운 일이다. 우리의 피부에는 땀구멍이 약
2백만 개 정도 분포되어 있는데
이마와 손바닥에 작은 구멍이 밀집되어 있고 큰 구멍은
겨드랑 밑, 배꼽, 사타구니, 젖꼭지
둘레에 많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손이나 발가락 사이에
있는 땀구멍이 작아 미처 땀이 잘
배출되지 못하면 땀이 고여서 조그만 물집이 생기는데
이런 한포를 무턱대고 무좀이라고
생각하여 치료하면 도리어 더 심하게 되는 수가 있다.
[여름철에 땀이 피부를 적신 채 내버려두면 좁살 알처럼
빨간 것이 생기는데 이것이
땀띠이며 땀띠가 터져서 종기가 된 것을 비창이라고 한다.
옥녀영이라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외형편 권3 피]
[옥녀영이라는 약은 땀띠가 가렵고 아픈 데 사용하며
활석 가루와 녹두 가루를 같은
분량씩 섞어 솜뭉치에 묻혀 두드려 발라준다. 황백과
대추나무 잎을 가루로 만든 것을 각각
20g씩과 편뇌(용뇌향이라고도하며 냄새 좋은 향료)를 소량
섞으면 더욱 좋다. 좁쌀 가루도
사용된다.] [외형편 권3 피]
좌비창청고전탕세지(땀띠에 쑥, 개사철쑥 또는
제비쑥을 달인 물로 씻으면 좋다)
대추잎을 찧어서 즙을 발라도 좋다고 되어 있다. 결국
옥녀영은 오늘날 아연화전분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해체: 설사 멎게 하고 몸 덥히는 선약]
더위에 지쳐서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도 되지 않아
뱃속이 거북할 때 산뜻하게 구미를
돋구어 주는 반찬거리가 있다.
일본식 음식점에서는 흔히 볼 수 있으나 우리 가정의
식탁에는 아직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생선 초밥을 먹을 때 곁들여 나오는 새앙(생강)
썰어 적인 것과 아울러 파밑동같이
생긴 것을 식초에 절여서 새콤하고 씹는 맛이 아작아작한
것이 나온다. 그게 염교(해체)라는
것인데 우리말보다도 일본 이름인 갓꾜라고 불러야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 마늘, 파, 달래와
마찬가지로 달래과에 속하는 식물의 인경인데 성분도
마늘이나 파와 비슷하며 냄새와
약리작용이 같다. 소화기능과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다.
[염교는 몸을 덥게 하여 주며 맛은 매우며 무독하다.
뱃속을 편하게하여 부며 오래
계속되는 설사, 뱃속이 냉해서 생기는 설사를 멈추어 주며
오한과 신열을 제거하고 부증을
없애준다. 몸을 튼튼하게하여 살찌게 한다. 염교는
따뜻하게 보해 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선도의 약방문이나 자연식 전문가들은 모두 염교를 빼놓지
못한다.] [탕액편 권2 체부]
원래 중구의 절강성이나 히말라야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옛부터
재배식물로 정착되어 왔다.
우리도 좀더 많이 보급하여 식탁에 오르게 되었으면
한다. 설탕을 섞은 식초에 담가
두었다가 먹어도 좋고 파나 마늘처럼 국에 넣어 끓여
먹어도 좋다. 미국에서도 염교를
식초에 절인 것이 인기가 있는데 마늘처럼 냄새가 대단치
않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으며
텁텁한 육식에 염교의 깨끗한 맛이 어울리기 때문이리라.
[청근: 체한 데 날무를 씹어 삼키면 좋다]
외국을 다녀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무를 이용한
음식물을 거의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음식의 특색 중의 하나가 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무가
없다면 김장, 김치, 깍두기는 생각도
할 수 없다. 이와같이 무를 상식하는 우리 민족인 만큼
오랜 동안의 무 때문에 생긴 체질의
특색 같은 것이 있을 법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연구된 것은
없다. 원래 무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이고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통하여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워낙 옛날 일이라
정확히 고증할 수가 없다.
고려 때의 이규보라는 학자가 쓴 책 가운데
<가포육영>이라는 시에서 여섯가지 채소를
읊은 가운데 순무가 나온다. 담근 장아찌는 여름철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인 김치
겨울내내 반찬되네. 뿌리는 땅 속에서 자꾸만 커서 서리
맞은 것 칼로 잘라 먹으니 배같은
맛이지. (이성우 교수 저서에서 인용)
무는 채소로서 뿐만 아니라 부기 소곡 이오감 경신 익기
모부족 이안색 지수
이소편... 좋다는 약효가 모두 망라되어 있다. 흔히
가정에서 무는 인삼 대신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다. <동의보감>에는 무를 단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열 군데나 열거하고 있다.
[무를 한자로 라복, 래복, 로복, 청근 등으로 쓴다.
무는 음식을 소화시키며 면류를 먹고
중독된 것을 풀어준다. 또 보리와 밀로 만든 음식을 먹고
체한 데 날부를 씹어 삼키면 좋다.
옛날에 서역의 중이 와서 사람들이 국수를 먹는 것을 보고
어쩌려고 그런 열이 있는 음식을
먹느냐고 하다가 무도 먹는 것을 보고는 옳거니 무를 믿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그후부터는
면류를 먹을 때는 반드시 무를 먹도록 하였다.] <잡병편
권4 내상>
일본식 모밀국수에 무 강즙이 곁들여 나오는 유래가
바로 이것이다.
병을 고치는 약이라는 것이 대체로 독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독성을 이용하여 병을
공격함으로써 치료하게 되는 것이다. 약을 무기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느데 적군을 물리치는
작용이 있는 반면 잘못 휘두르면 때로는 엉뚱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모든 잡병을 다스릴 때
우선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에 병을
고치도록 하며 위의 소화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혈에 병이
생기면 먼저 기운을 북돋아주어야 하는데 기운을 조절하여
주지 않고는 혈액 순환도 잘되지
못하는 이치이다. 그러므로 병을 치료하는 데는 기가
근본이 되며 이를테면 남편이 해당되니
남편에 해당되니 남편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아내가 따라서 노래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보약이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복용하여 소화시킬
수 있어야지 보약을 마시고 위가
나빠지면 보약의 구실을 못하게 된다.] [잡병편 권1
용약]
[대저 병을 공격하는 약은 병이 있을 때는 병이 그 약을
받지만 병이 가벼운데 약력이
중하면 위의 소화기능이 상하게 된다. 위의 소화 기능은
청순하고 부드러워 자극성 없는
것을 좋아하는데 음식물인 곡식, 육류, 채소, 과일 등은
위에 좋지만 약은 모두 성질이
편벽된 약리작용을 지니고 있으며 그 좋다는 인삼이나
황기 같은 보약도 역시 편성인데
하물며 공격지약은 더할 나위도 없다.] [잡병편 권1
용약]
병이 아주 급할 때는 앞뒤를 가릴 겨를이 없이 독한
약을 때려야 하겠지만 병이 일단
수그러지면 독한 약은 끊도록 하는 것이 약 사용의 정석인
것이다.
[옥녀영: 땀띠는 쑥 달인 물로 씻으면 좋다.]
땀띠를 한진이라고 하며 땀띠가 덧나서 종기가 된 것을
한진성습진이라고 한다.
옛사람들도 땀띠를 비자라고 하고 종기가 된 것을
비창이라고 하였다.
땀을 흘린다는 것은 인체가 체온을 자동 조절하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며, 더위가
심한 여름에는 하루에 맥주병 4개 정도의 땀이 나오며
운동을 하면 이의 갑절 정도가
나온다니 놀라운 일이다. 우리의 피부에는 땀구멍이 약
2백만 개 정도 분포되어 있는데
이마와 손바닥에 작은 구멍이 밀집되어 있고 큰 구멍은
겨드랑 밑, 배꼽, 사타구니, 젖꼭지
둘레에 많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손이나 발가락 사이에
있는 땀구멍이 작아 미처 땀이 잘
배출되지 못하면 땀이 고여서 조그만 물집이 생기는데
이런 한포를 무턱대고 무좀이라고
생각하여 치료하면 도리어 더 심하게 되는 수가 있다.
[여름철에 땀이 피부를 적신 채 내버려두면 좁살 알처럼
빨간 것이 생기는데 이것이
땀띠이며 땀띠가 터져서 종기가 된 것을 비창이라고 한다.
옥녀영이라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외형편 권3 피]
[옥녀영이라는 약은 땀띠가 가렵고 아픈 데 사용하며
활석 가루와 녹두 가루를 같은
분량씩 섞어 솜뭉치에 묻혀 두드려 발라준다. 황백과
대추나무 잎을 가루로 만든 것을 각각
20g씩과 편뇌(용뇌향이라고도하며 냄새 좋은 향료)를 소량
섞으면 더욱 좋다. 좁쌀 가루도
사용된다.] [외형편 권3 피]
좌비창청고전탕세지(땀띠에 쑥, 개사철쑥 또는
제비쑥을 달인 물로 씻으면 좋다)
대추잎을 찧어서 즙을 발라도 좋다고 되어 있다. 결국
옥녀영은 오늘날 아연화전분과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해체: 설사 멎게 하고 몸 덥히는 선약]
더위에 지쳐서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도 되지 않아
뱃속이 거북할 때 산뜻하게 구미를
돋구어 주는 반찬거리가 있다.
일본식 음식점에서는 흔히 볼 수 있으나 우리 가정의
식탁에는 아직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생선 초밥을 먹을 때 곁들여 나오는 새앙(생강)
썰어 적인 것과 아울러 파밑동같이
생긴 것을 식초에 절여서 새콤하고 씹는 맛이 아작아작한
것이 나온다. 그게 염교(해체)라는
것인데 우리말보다도 일본 이름인 갓꾜라고 불러야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 마늘, 파, 달래와
마찬가지로 달래과에 속하는 식물의 인경인데 성분도
마늘이나 파와 비슷하며 냄새와
약리작용이 같다. 소화기능과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다.
[염교는 몸을 덥게 하여 주며 맛은 매우며 무독하다.
뱃속을 편하게하여 부며 오래
계속되는 설사, 뱃속이 냉해서 생기는 설사를 멈추어 주며
오한과 신열을 제거하고 부증을
없애준다. 몸을 튼튼하게하여 살찌게 한다. 염교는
따뜻하게 보해 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선도의 약방문이나 자연식 전문가들은 모두 염교를 빼놓지
못한다.] [탕액편 권2 체부]
원래 중구의 절강성이나 히말라야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옛부터
재배식물로 정착되어 왔다.
우리도 좀더 많이 보급하여 식탁에 오르게 되었으면
한다. 설탕을 섞은 식초에 담가
두었다가 먹어도 좋고 파나 마늘처럼 국에 넣어 끓여
먹어도 좋다. 미국에서도 염교를
식초에 절인 것이 인기가 있는데 마늘처럼 냄새가 대단치
않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으며
텁텁한 육식에 염교의 깨끗한 맛이 어울리기 때문이리라.
[청근: 체한 데 날무를 씹어 삼키면 좋다]
외국을 다녀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무를 이용한
음식물을 거의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음식의 특색 중의 하나가 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무가
없다면 김장, 김치, 깍두기는 생각도
할 수 없다. 이와같이 무를 상식하는 우리 민족인 만큼
오랜 동안의 무 때문에 생긴 체질의
특색 같은 것이 있을 법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연구된 것은
없다. 원래 무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이고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통하여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워낙 옛날 일이라
정확히 고증할 수가 없다.
고려 때의 이규보라는 학자가 쓴 책 가운데
<가포육영>이라는 시에서 여섯가지 채소를
읊은 가운데 순무가 나온다. 담근 장아찌는 여름철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인 김치
겨울내내 반찬되네. 뿌리는 땅 속에서 자꾸만 커서 서리
맞은 것 칼로 잘라 먹으니 배같은
맛이지. (이성우 교수 저서에서 인용)
무는 채소로서 뿐만 아니라 부기 소곡 이오감 경신 익기
모부족 이안색 지수
이소편... 좋다는 약효가 모두 망라되어 있다. 흔히
가정에서 무는 인삼 대신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다. <동의보감>에는 무를 단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열 군데나 열거하고 있다.
[무를 한자로 라복, 래복, 로복, 청근 등으로 쓴다.
무는 음식을 소화시키며 면류를 먹고
중독된 것을 풀어준다. 또 보리와 밀로 만든 음식을 먹고
체한 데 날부를 씹어 삼키면 좋다.
옛날에 서역의 중이 와서 사람들이 국수를 먹는 것을 보고
어쩌려고 그런 열이 있는 음식을
먹느냐고 하다가 무도 먹는 것을 보고는 옳거니 무를 믿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그후부터는
면류를 먹을 때는 반드시 무를 먹도록 하였다.] <잡병편
권4 내상>
일본식 모밀국수에 무 강즙이 곁들여 나오는 유래가
바로 이것이다.